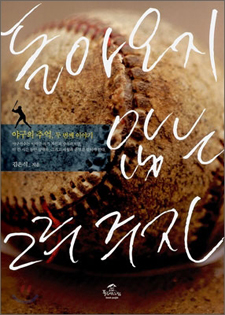
도원야구장 앞길에서라도 우연히 만난다면 무심코 "미안하다"는 말이 튀어나올 것 같은, 그래서 "누구신가?" 하는 황당한 표정이 돌아오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사인을 한 장 부탁하게 될 것 같은 내 마음의 에이스 최창호. 그래서 가끔 오랜만에 메이저리그로 복귀한 박찬호가 다시 된통 얻어맞다 내려갔다거나 하는 씁쓸한 복귀 소식 뒤끝에 이유 없이 종종 떠오르는 그 이름. 뜬금없지만, 고백하건대 사실 나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팀 돌핀스의 유민 중 한 사람이다. -p.159
언젠가부터 야구를 좋아한다는 말은 좀 촌스러운 표현이 됐다.
야구 응원팀을 묻는 설문조사는 '응원팀 없음'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미국에서도 '야구는 20세기의 스포츠'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린다.
어쩌면 나는 그 촌스러움을 부정하고 싶어서 '숫자의 추억'에 빠지게 된 건지도 모르겠다.
남들은 잘 모르는 이상한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읽는지도 잘 모르는 그래프를 그린 다음 "그건 당신이 무식해서 모르는 거야. 봐, 이렇게 '세련된 방식'으로 야구를 즐길 수 있다고!" 이렇게 헛된 외침을 허공에 지르고 싶었던 모양.
하지만 나는 김은식 씨가 지극히 '촌스럽게' 써내려간 문장 앞에 곧잘 우두커니 멈추어 서고는 했다.
내가 온갖 숫자를 들먹이며 '추억을 팔자'고 외칠 때 묵묵히 '추억을 살고 있는' 김은식 씨의 문장은 그렇게 내 눈물을 찔끔 짜고는 했다.
그렇다. 김은식 씨의 글은 언제나 "인간에 대한 예의"로 가득 차 있다.
'가루가 될 때까지 까여도' 좋을 플레이를 따뜻하게 감싸는 배려, 누군가의 진정성을 받아들이는 '솔직한' 포장.
그래서 나는 김은식 씨를 "야구 인문학자"라고 칭한다.
야구를 가지고 삶을 아파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야구 글'을 가지고 "정말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김은식 씨뿐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미 읽은 적이 있는 글들, 그리고 미처 접하지 못했던 글들이 모여 있는 이번 책을 읽으면서 나는 역시나 미안함에 시달렸다. 어쩐지 '베이스볼 보이'의 의무를 떠넘긴 것만 같은 막연한 미안함.
김은식 씨 글이 이렇게 '잘 읽히는 것'은 사실 나처럼 의무를 포기한 이들의 미안한 때문은 아닐까.
노장을 영웅으로 만들 권리를 찾아 목소리를 높이고, 야구가 너무도 고맙던 그 시절을 잊어가는 듯한 미안함.
그렇게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의무감에 어린 날의 역사와 도리를 잊어가는 많은 '베이스볼 보이'.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읽고 내 휴대전화에 '야구인'으로 저장된 이들과 함께 동이 틀 때까지 술잔을 기울였다.
맞다. 내 마음 한 켠에서는 아직도 가끔 1996년 한국 시리즈에서 노히트 노런을 기록한 정명원의 포효가 들리고, 1992년 김홍집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흘렸던 서러운 울음이 사무친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야구라는 소실점 하나로 모였던 그 때가 사무치게 그립다. 영원히 '베이스볼 보이'로 살 줄 알았던 그 때의 내게 정말 너무도 미안하다. 내가 숫자로 함부로 평하는 선수들에게도.
때로 사람들은 야구 선수 또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는다. 그래서 세상 사람 모두가 알만한 업적을 남기지 못하면 '선수도 아니라는' 철없는 생각도 가끔 한다. 그들 중 누구도 세계 최고의 샐러리맨, 세계 최고의 학생이거나 세계 최고의 주부로서 번듯한 기록하나 세워놓지 못했음에도, 저마다 글로 풀자면 책 몇 권을 써도 부족한 감동과 희열과 분노를 품은 귀한 삶들이라는 사실을 가끔 잊는다. -p.208~p.209
김은식 씨, 언제 '홈런 슈퍼' 앞에서 소주 한 잔 하시죠?
+
좋은 책을 선물해 주신 서영호 사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